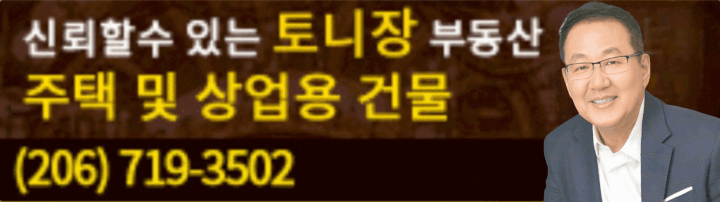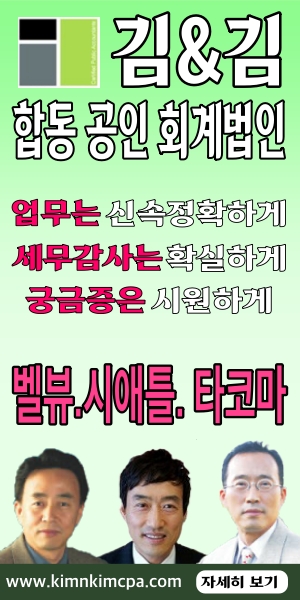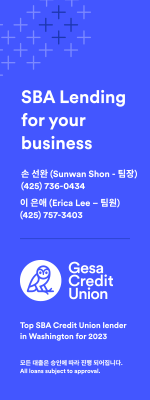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24-06-24
김윤선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원)
찬란한 빛의 밤
손님이 왔다.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산 손님이다. 이름은 오로라, 어떤 이는 부러 비싼 경비를 들여서 손님 보러 가는데 오늘은 스스로 이곳을 찾아왔으니 내겐 횡재다.
북쪽이 훤하게 트인 넓은 공간을 찾아라, 손님을 맞는 특명이다. 어떤 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바다로, 호수로 길을 떠난다고 했다. 나는 동네 언덕 위 넓은 공터에 갔다. 공짜 구경인 마당에 투정할 주제가 아니다.
시애틀에 출현하는 오로라는 최강의 태양 폭풍 때문이라고 했다. 태양풍과 지구의 자력이 충돌해 생기는 일종의 방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 지식의 한계 밖이어서 그저 보이는 대로만 보기로 했다.
오로라는 신세계였다. 빛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에서 미처 만나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한 황홀함과 신비함으로 경외감조차 들었다. 물감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하면서도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밤마실이라 하기엔 참 멀리까지도 왔다. 북극권에서만 맴돌던 조신한 행동이 이참에 태양 폭풍을 핑계 삼아 반란이라도 일으킨 것일까. 당찬 모습까지 내비치니 감동이 더해진다. 불끈불끈 솟구치는 빛에서 용트림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켜켜이 쌓인 두터운 어둠을 뚫고 드러나는 오로라의 향연, 던지듯 쏟아지는 빛줄기들이 눈부시다. 발랄하면서도 요염한 선홍색, 신록보다 더 싱그러운 연두색, 우아한 듯 그늘져 보이는 보라색, 파닥이는 병아리의 날개 빛 닮은 노란색 등 저마다의 색으로 같이 또 따로 빛을 토해낸다. 독무를 추기도 하고 군무를 즐기기도 하는 빛의 환락, 저 빛들은 진정 누구의 솜씨일까.
빛이라고 다 밝고 환하지만은 않았다. 서로 뒤엉켜 힘의 대결을 벌이다가 함께 소멸하기도 하고 돌연 쏟아지는 붉은빛은 꼭 화마 같았다. 입체파 작가의 음울한 미술작품을 닮은 것도 있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았던 쥐불놀이가 생각났다. 아이들은 깡통 바닥과 옆에 구멍을 뚫어 철사로 긴 고리를 끼워 넣었다. 깡통에 나무 조각들을 넣고 불을 피워 윙윙, 깡통 돌리기를 했다. 불꽃이 동그라미를 그렸다. 키 큰 아이들은 큰 동그라미를, 키 작은 아이들은 작은 동그라미의 불꽃을 만들었다.
빈 들판을 밝히는 불꽃은 마치 도깨비불 같았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따라 도깨비들이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어둠이 짙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다 같이 그것들을 저 멀리 하늘 높이 던졌다. 깡통에 남아 있던 불씨들이 흩날리면서 화려한 불꽃이 일었다. 호롱불 하나 없는 들판에서 날개 펼치던 불깡통 놀이, 어린 시절에 만난 빛의 세계였다.
한참을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순간순간 알지 못할 감정이 솟구쳤다. 화려함 뒤에 설핏설핏 드러나는 어둠의 기색, 아픔이랄까, 서글픔이랄까. 눈물을 가리려고 크게 웃는, 그래서 더 슬퍼 보이는 피노키오 웃음 같은 게 보였다. 그러고 보면 저들 또한 희로애락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양이다.
불현듯 저 화려한 빛이 지난날 발화하지 못한 꿈 조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무심코 들었다. 화려하지만 허황한 꿈, 그래서 더더욱 실현하지 못한 꿈 말이다.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곳이 현실이고, 이 시각이 현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는 동안 그 꿈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빛일수록 크고 원대했던 꿈의 흔적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저마다 들이대는 카메라 속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을까. 내일 아침엔 공유하는 사진 속에서 오로라가 또 한 번 살아나겠지. 이미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오로라, 기억의 창고 속에 살며시 포개 넣었다.
깊은 밤 시각, 돌아오는 밤하늘엔 여전히 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별빛 때문인지 마음이 평온해졌다. 큰 별 작은 별, 저마다의 빛으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귀한 손님을 맞은 밤하늘, 오로라와 함께 한 찬란한 빛의 밤이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