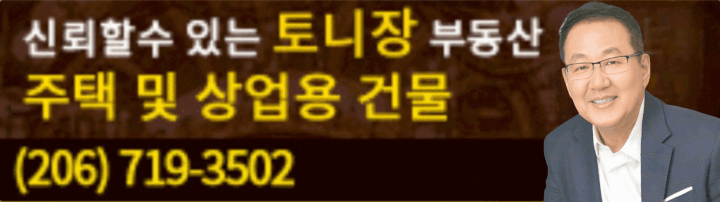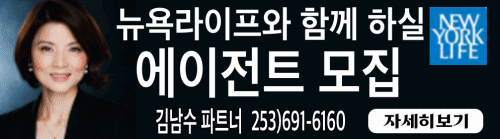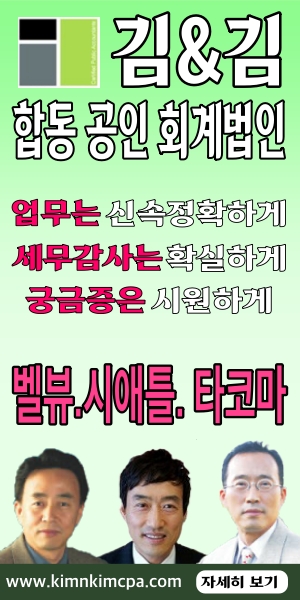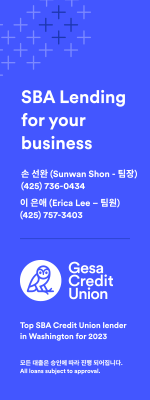"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24-06-25
노동시간 단축 여파…"시간제 근로자 많이 늘어"
10억 쓰면 일자리 9.7개…2015년 12명서 2개 줄어
우리나라의 전일제 취업자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3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늘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 도입, 플랫폼 노동 활성화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노동시간 단축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취업자수는 2444만명으로 2015년(2483만명)에 비해 1.6%(-39만명) 감소했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앞서 산업연관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고용표는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에 해당한다.
고용표에 나타나는 총 취업자 수는 '전업 환산 기준(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환산)'을 따른다. 예컨대 주 36시간 이상 소위 '풀타임' 일하는 근로자를 1명으로 보고, 아르바이트 형태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1명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로 합계하는 식이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일제로 전환하다 보니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 형태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73.6%→74.4%) 비중이 상승했다. 성별 비중(남 61.0%, 여 39.0%)은 2015년과 동일했다.
특히 상용직 비중이 상승(+6.3%p)했는데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79.3%→76.5%)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용직(51.9%→58.2%) 비중이 올랐다.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34.0%→45.8%)와 부동산 서비스(37.5%→49.1%)에서 더욱 치솟았다.
부문별로는 공산품 비중은 하락(-1.2%p)하고 서비스는 소폭 상승(+0.1%p)했다. 공산품의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1.4%→0.8%) 등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비중이 작아졌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양방향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6.3%→7.5%) 등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14.2%→12.9%) 등은 감소했다.
2020년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2015년(11.7명)에 비해 2.0명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상품에 대한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마다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취업유발계수가 9.7명이라는 것은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10명 아래라는 얘기다. 지난 2005년 20.3명에 비해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특히 공산품(7.3명→6.3명)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과 목재 및 종이, 인쇄를 중심으로, 서비스(15.0명→11.5명)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뉴스포커스